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오뉴월 불과 마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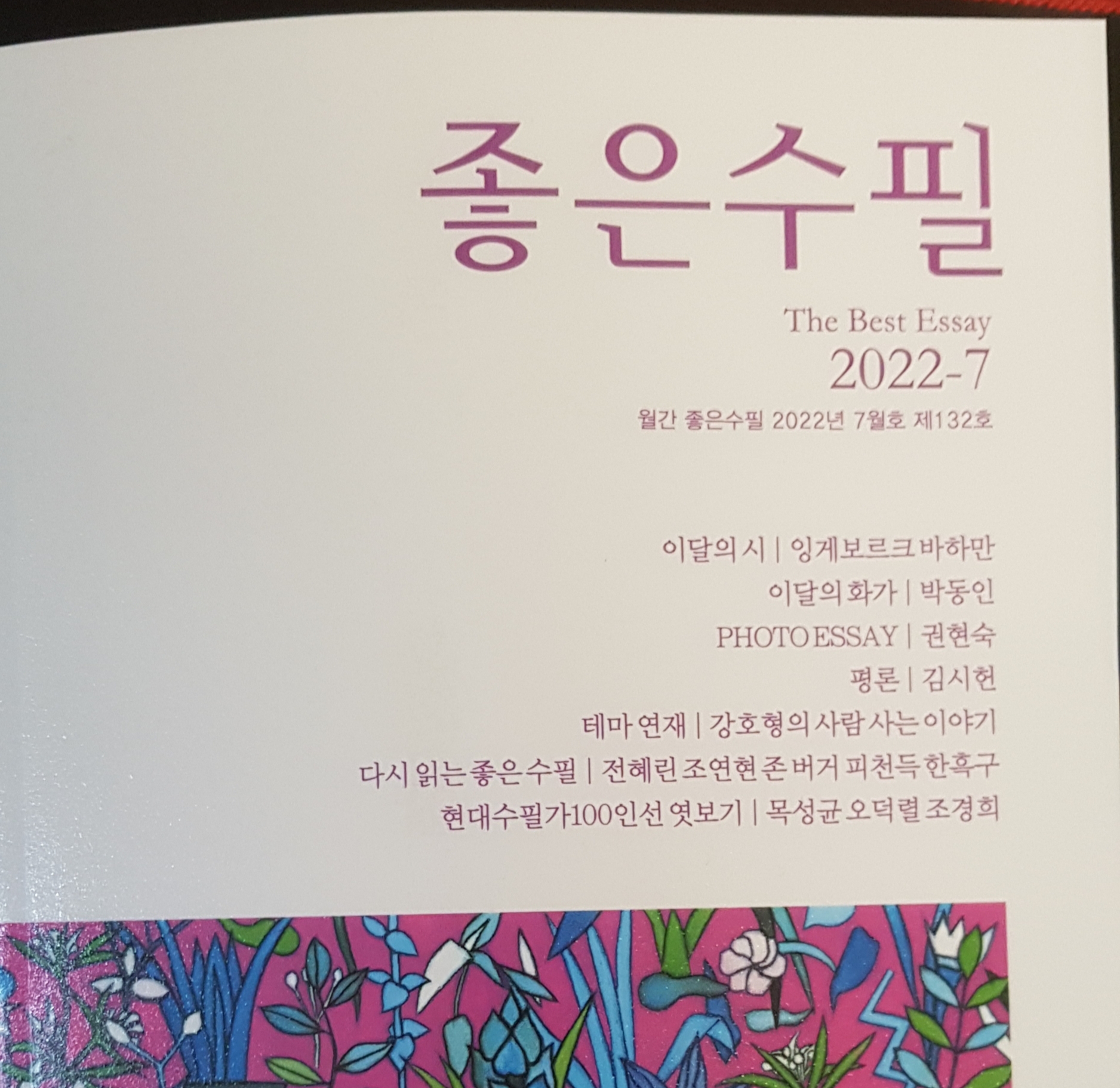
< 다음 글은 수필전문 월간지 '좋은수필'2022년7월호에 실린 저의 기고문 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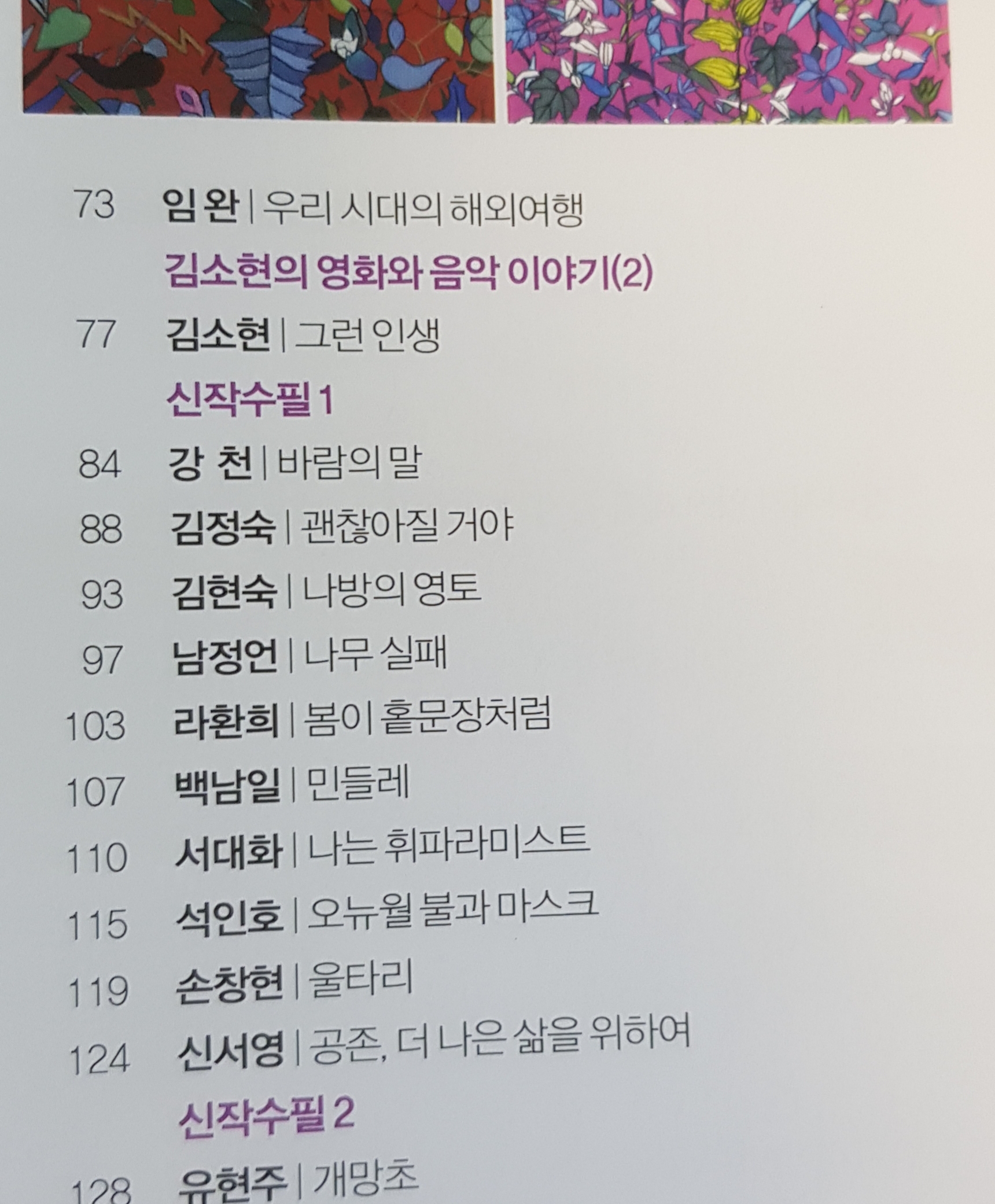
우리는 2년 넘게 단짝처럼 붙어 다녔다. 남들에게 가장 잘 보이도록 ‘나 좀 보란 듯이 붙어서’ 다녔다. 춘풍추우를 문제 삼지 않았고 엄동의 맹추위와 염천의 무더위도 우리를 떼어놓지 못했다. 어쩌다 실수로 서로 떨어졌다면 곧 바로 찾아야 했다. 행여 헤어진 단짝의 행방을 모른다면 한 바탕 곤욕을 치러야만 했다. 둘이 함께라면 못 갈 데가 없었지만 떨어지면 갈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았다. 그런 간난과 곤욕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긴 시간 정말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잘 지내왔다. 그랬던 우리지만 이젠 서로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다. 언젠가 닥치리라 예상했지만 한편으론 좀 서운하다.
50여 년 전 어느 여름날 일이었다. 당시는 학원가의 반정부 시위가 극심해 툭 하면 장기간 휴교령이 내리곤 했다. 대학생이었던 나는 휴교령이 내리면 고향에 가서 아버지의 농사일을 거들곤 했다. 어느 날엔 불볕더위를 무릅써야 했고 또 다른 날엔 장대처럼 퍼붓는 비를 맞기도 했다. 농사일이란 때를 놓치면 안 된다. 때맞춰 모를 내거나 파종하고 김을 매고 거두어 들여야 한다. 그래서 농사일은 날씨가 일하기에 좋고 나쁨을 따질 수가 없다.
그날은 마을 사람들 여럿이 품앗이로 널따란 논에 모내기를 하는 날이었다. 모내기는 비슷한 시기에 집집마다 서로 날짜를 정해 순서대로 심는다. 미리 정한 날이기에 비가와도, 천둥번개가 쳐도 모내기는 그 날 안 하면 곤란해진다. 서로의 일정이 짜여있기 때문이다. 그날은 아침부터 잔뜩 흐렸다가 한낮부터 요란하게 비가 퍼부어 댔다. 여름철 모내기하다 비 맞기는 흔한 일이지만 그날은 좀 심했다.
모를 심는 사람들은 주로 여자들이었지만 힘 드는 일들이 좀 있어 남자들도 몇 사람 함께 일했다. 논두렁 가의 나무 아래로 잠시 피했다가 빗줄기가 약해지면 다시 일하기를 반복해야 했다. 중간에 새참으로 끓여서 나온 수제비의 뜨끈한 국물로 찬비 맞아 한기가 든 몸을 달래며 일을 했다. 그런데 비는 계속 오락가락 내렸다. 비 맞으며 물속에서 모를 내려니 차차 추위가 엄습하기 시작했다.
비옷들을 입었지만 밀려드는 심한 한기를 막기가 힘들었다. 오뉴월의 더위는 익히 잘 알았지만 오뉴월의 추위가 이렇게 참기 힘든 줄은 몰랐다. 게다가 그날은 바람까지 솔솔 불어 추위가 더욱 심하게 느껴졌다. 특히 여자들은 입술까지 파래지며 무척 힘들어 했다. 그렇다고 모내기를 중단할 수도 없다. 아니 농사꾼들은 비 온다고 해야 할 일을 중단 하지도 않는다.
이 때 구세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오뉴월 불’이었다. 남자들 몇 명이 마을로 가서 불을 피울 수 있는 나뭇가지와 장작, 불쏘시개 등을 지고와 논가 공터의 나무 아래에다 불을 피웠다. 비가 내렸지만 한 번 붙은 장작불은 꺼지지 않고 잘 타올랐다. 사람들은 일하다 추워지면 나와서 불을 쬔 후 다시 일했다. 비만 안 왔다면 폭염이 쏟아졌을 6월 하순에 추위를 달래려고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을 피우는 일이 생긴 것이다.
2년간 위력을 떨치며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코로나19가 드디어 안정세로 접어드는 것 같다. 함께 붙어있지도 못 했고, 4명 이상은 한 자리에 앉아 식사도 못 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고생했고 그중 증세가 심했던 일부 사람들은 유명을 달리 하기까지 했다. 학교는 장기간 휴교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재택수업을 했다. 직장도 재택근무 하거나 아예 부분적 조업중단까지 감수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을 상대로 거의 강제적으로 방역접종까지 실시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만 했다.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코로나19 예방수단이라고 했다.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못 하게 했고 공공장소 출입까지 엄격히 제지당했다. 덥든 춥든, 싫든 좋든 불문코 입과 코를 확실하게 가리지 않으면 안 됐다. 온갖 불편을 감수하면서 얼굴을 가리고 다닌 일이 어언 2년이 넘었다. 그 시간을 보내며 나도, 남들도 이젠 마스크에 익숙해져 쓰는 게 일상화 되고 말았다.
그런데 며칠 전 정부에서 마스크 착용조치를 대폭 완화했다. 5월부터 실내나 밀접한 만남을 제외하고 길거리 등 야외나 실외에선 쓰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모임참석자 인원제한도 풀었다. 얼마나 기다렸던 조치인가? 그런데 엉뚱한 반전이 일어났다. ‘얼씨구나’ 하고 마스크를 벗어 던질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쓰고 다니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아 불안하기 때문일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마스크 분리불안’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들도 심한 여름한기를 달래주었던 오뉴월 불 옆을 떠나려 하지 않았던 그 여름날의 사람들과 같은 심정일까?. ‘오뉴월 불’도 쬐다 물러나면 서운하다고 했다. 마스크를 벗지 않는 사람들도 ‘벗으면 코로나 감염’이 걱정돼서 계속 쓰고 다니는 걸까?
석 인 호 <좋은수필 2014년 등단>
'수필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정25 길걷기 (0) | 2023.06.17 |
|---|---|
| 75세 初老의 하프마라톤 완주기 (0) | 2023.05.01 |
| 자식 흉보기 (0) | 2021.10.01 |
| 달빛이 말을 걸다. (0) | 2021.07.30 |
| 기품 있게 늙고 싶다 (0) | 2021.07.07 |




